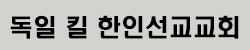자유
단상 1.
어른의 하루는 짧아도, 아이의 하루는 길다. 그 길고 긴 날 우리 마을 맨 꼭대기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갔다. 전봇대라곤 마을 사이에 듬성듬성 나있던 시절, 전기가 있지만 돈 아깝다며 일찍 불끄고 호롱불 피우며 저녁을 보내는 시절, 아무도 없는 텅빈 집을 대낮에 오다니며 노는 아해들에게는 컴컴한 방이 싫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무서운 성냥개피를 집어들어 코를 찌르는 황냄새 맡으며 그린다. 가끔씩은 손도 대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위협으로 우리들의 어린 용기를 막을 수 없었고, 기어이 불을 붙이고 호롱불을 밝힌다. 친구집 흙벽돌에서 풍기는 황토 흙냄새와 어룰려진 지면의 축축한 기운이 살깥에 닿으며 다시는 오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호롱불이 책 더미 위에 얻쳐있다. 호롱불 속에 친구의 얼굴이 어른 거린다. 언젠가 모르게 무슨 이유로 이사를 떠났는데.......
단상 2.
습한 공기를 내쉬며 나르는 갈매기 한 마리가 퍽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꽤 넓은 팔로 하늘을 기울이며 비행하고 있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낭만과 자유가 있다. 나는 왜 나는 물체를 보면 어디로 나는지 궁금해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나 자신을 보면 달팽이 노랫 가사처럼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소리 따라서’ 부단히 걸음마 재촉하면서 이따금씩은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걸어가는 내가 들통나는 기분이다.
요즘 들어서는 내도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정말 정말 호기심도 많고 흥미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그러면 모든 흥미·재미·의미가 증발될 것 같아서 싫다)과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 속에 떠올릴 때마다 ‘너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걷는 걸음이 재미있기에 그 재미에 홀려서 계속 걷는다. 모난 것도 많고 갖추어진 것도 없지만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고 가슴 뿌듯하게 살아가는 꿈만 같은 현실이 언제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단상 3.
책을 보면 또 하나의 생각..... 책 더미를 쌓고 그 위에 등대를 비추면 모든 바다는 다 비출 수 없어도 아침을 기다리며 뭍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그 불빛은 본다. 몇 개의 대형 램프를 가지고 긴 빛줄기로 비추는 늘신하고 든든한 등대는 아니지만, 아담한 등대에 작음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밀물이 들이닥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른의 하루는 짧아도, 아이의 하루는 길다. 그 길고 긴 날 우리 마을 맨 꼭대기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갔다. 전봇대라곤 마을 사이에 듬성듬성 나있던 시절, 전기가 있지만 돈 아깝다며 일찍 불끄고 호롱불 피우며 저녁을 보내는 시절, 아무도 없는 텅빈 집을 대낮에 오다니며 노는 아해들에게는 컴컴한 방이 싫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무서운 성냥개피를 집어들어 코를 찌르는 황냄새 맡으며 그린다. 가끔씩은 손도 대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위협으로 우리들의 어린 용기를 막을 수 없었고, 기어이 불을 붙이고 호롱불을 밝힌다. 친구집 흙벽돌에서 풍기는 황토 흙냄새와 어룰려진 지면의 축축한 기운이 살깥에 닿으며 다시는 오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호롱불이 책 더미 위에 얻쳐있다. 호롱불 속에 친구의 얼굴이 어른 거린다. 언젠가 모르게 무슨 이유로 이사를 떠났는데.......
단상 2.
습한 공기를 내쉬며 나르는 갈매기 한 마리가 퍽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꽤 넓은 팔로 하늘을 기울이며 비행하고 있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낭만과 자유가 있다. 나는 왜 나는 물체를 보면 어디로 나는지 궁금해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나 자신을 보면 달팽이 노랫 가사처럼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소리 따라서’ 부단히 걸음마 재촉하면서 이따금씩은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걸어가는 내가 들통나는 기분이다.
요즘 들어서는 내도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정말 정말 호기심도 많고 흥미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그러면 모든 흥미·재미·의미가 증발될 것 같아서 싫다)과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 속에 떠올릴 때마다 ‘너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걷는 걸음이 재미있기에 그 재미에 홀려서 계속 걷는다. 모난 것도 많고 갖추어진 것도 없지만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고 가슴 뿌듯하게 살아가는 꿈만 같은 현실이 언제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단상 3.
책을 보면 또 하나의 생각..... 책 더미를 쌓고 그 위에 등대를 비추면 모든 바다는 다 비출 수 없어도 아침을 기다리며 뭍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그 불빛은 본다. 몇 개의 대형 램프를 가지고 긴 빛줄기로 비추는 늘신하고 든든한 등대는 아니지만, 아담한 등대에 작음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밀물이 들이닥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